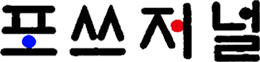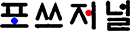[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민간투자사업 구간의 착공이 시작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정부에 실착공계를 제출하고 첫 삽을 뜬 것이다.
기쁜 일이지만, 걱정스럽기도 하다.
지하 50m 이상을 굴착하는 대심도 공사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 관리와 수익성에 쫓기다 자칫 안전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빠르게'보다 '안전하게'가 전제가 돼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순서가 종종 뒤바뀐다.
실제 4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신안산선 공사 현장이 붕괴돼 사망자 1명, 중상자 1명이 발생한 바 있다.
GTX-B는 대부분 구간이 지하 터널이며, 쉴드TBM이나 NATM 등 고위험 공법이 적용된다.
이러한 방식은 시공 오차나 설계 오류, 지반 불안정 등에 따른 침하·붕괴 사고 가능성이 상존한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은 긍정적이지만, 빠른 착공이 곧 '안전한 공사'를 의미하진 않는다.
오히려 착공을 둘러싼 일정 압박과 예산 절감 요구는 시공사와 하도급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진에게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현장에서는 여전히 '겉으로만 갖춘 서류'가, '있으나 마나 한 체크리스트'가 통용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책임의 분산 구조다.
원청과 감리, 하청, 재하청이 뒤엉킨 다단계 계약 구조에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공방'만 반복될 뿐,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는 실종되기 쉽다.
특히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GTX-B는 사업자와 시공사, 운영사, 정부 간의 책임 경계가 더욱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도 크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생명이다.
지금 필요한 건 중대재해 이후의 대책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중심에 두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와 발주처는 민자와 재정 구간을 불문하고 공기 준수보다 안전 확보를 우선시하는 구조적 감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공정률 수치보다 중요한 건,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다.
'GTX가 다니는 세상'이 오기 전에, '사람이 다치지 않는 현장'이 먼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