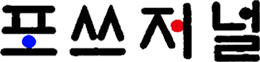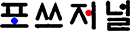[포쓰저널=박소연 기자] 국내 은행권에서 반복되고 있는 금융사고가 임계점을 넘어섰다. 매달 수십억원대의 배임과 횡령, 사기가 터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최근 IBK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882억원대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9명을 재판에 넘긴 사실은 한국 금융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일 기업은행 전 직원이자 시행사 대표인 김모씨와 여신심사센터장이었던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과 공모한 은행 관계자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씨는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한 뒤 내부 직원들과 공모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받았으며, 이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대가를 챙겼다.
조씨는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들을 압박해 대출을 승인하고거액의 대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이 공시한 사고 규모는 239억5000만원 규모였으나 금감원 현장 검사 결과 부당대출은 882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기업은행 감사가 시작되자 허위 매출 영수증을 만들어내는 등 은폐 시도까지 감행했다.
문제는 이같은 초대형 금융사고가 특정 은행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 들어서만 국민은행에서 6건, 하나은행 5건, 신한은행 2건, 농협은행 2건의 금융사고가 잇달아 공시됐으며, 이들 4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사고액은 900억 원을 넘어섰다. 범죄 양상도 다양하다.
전세사기, 태양광 사업 대출 사기, 내부자의 신용등급 조작까지 각양각색이다. 대부분은 사고 발생 수년이 지난 뒤 뒤늦게야 보고된 사례다.
심지어 디지털 혁신을 앞세워 ‘안전지대’로 인식됐던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사고가 터졌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직원의 27억원대 횡령 사건을 공시했다. 업계가 급성장하는 동안 내부통제, 윤리 의식, 리스크 감시 시스템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제안하며 강력한 시장 정화 의지를 보였다.
이제는 은행권의 구조적 범죄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기업은행 사례처럼 고위직이 연루된 대규모 금융범죄는 단순한 내부 감시 실패가 아니라, 조직문화 자체의 병폐이자 시스템 붕괴다.
‘자정’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금융사고가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은행들의 자율 개선이나 금융당국의 사후 대응에만 기댈 수 없다.
금융당국은 조직 개편 이후 내부통제 지표 공개, 대출 의사결정권 다단계 검증, 부정수익 환수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동시에 은행 임직원의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와 외부 감사 강화 등의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
K-금융의 신뢰는 기술이 아니라 ‘책임’과 ‘윤리’ 위에 세워진다. 지금이야말로 금융산업의 체질을 근본부터 바꿔야 할 결정적 시점이다. 이 땅의 금융이 더 이상 ‘범죄의 온상’으로 불리지 않게 하려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경고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