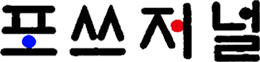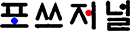국회 '지속가능한 패션산업 생태계 구축' 정책토론회

[포쓰저널=신은주 기자] 의료 수거함이나 재활용 봉투에 버려지는 수 많은 옷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태선·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패션산업 생태계 구축' 정책토론회에서는 의류 재고 소각에 대한 문제점과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김태선 의원은 주제 발표에 앞서 "패스트패션의 끊없는 도전 속에 수없는 옷이 버려지고 있다"며 "국내 71개 상장 회사들이 발표한 폐의류와 정부 통계에 잡힌 폐의류의 갭 차이는 무려 214만여 톤이다.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몰래 소각하고 버린다. 그 대가는 환경이 치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나선 정주연 (사)다시입다연구소 대표는 "전 세계 폐수의 20%가 패션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알다시피 바다를 오염시킨다"며 "의류 재고 문제는 인권 문제도 야기한다. 의류재고 산업의 노동은 전 세계 아동 노동의 70%를 차지한다"고 했다.
이어 "의류의 재고 문제는 기업들이 얼마나, 얼만큼 걸리고 남았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등의 제도가 없다. 브랜드 희소성을 지키기 위함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고량을 최소화하는 의류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폐기 행위를 거쳐 순환 경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미 사단법인 선 변호사는 '외국의 법제화 사례 분석'을 통해 의류 재고 문제의 심각성을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우선 프랑스와 스페인, 스코틀랜드 등 유럽의 국가에서 의류 폐기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어떤 법과 제도를 두고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재고 폐기를 금지하고 재고를 자선 단체에 기부하거나 재사용, 재활용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다.
2020년 판매되지 않은 의류 상품의 폐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순환 경제를 위한 낭비법을 통과시켰다.
스페인은 섬유 생산자 체임 제도를 도입할 것을 예고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별도의 섬유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했다.
스코틀랜드는 의류 폐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미 의류제품에 대한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가 도입돼 소비지가 디지털 여권을 통해 제품이 환경적인지를 파악하고 소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의류 재고 폐기를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관련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거나 재고를 기부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의류 폐기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독일은 2020년 10월 23일 개정된 수원 경제 촉진 및 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제조물의 폐기물화 방지 의무를 두고 있다.
벨기에에서는 의류 재고 폐기와 기부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유럽을 벗어나 미국은 의료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비욘드 더 빈'이라는 사이트에서 리사이클 의류 재고 제품이나 의류 제품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기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일본은 순환 경제로 이행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돼 있다.
토론자들은 국내에 순환 경제를 위한 기술과 제도 등이 부족하다는데 공감했다.
김수현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김태선 의원의 "2016년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 관련 제재 방안이나 구체적인 시스템이 부진한 것 같다. 20대, 21대 국회에 법 개정안이 나온 것이 있느냐"는 지적에 "당시에는 재산권의 사유 문제가 컸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에 수긍했다.
박영수 한국패션산업협회 상무이사는 "회원사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해봤는데 대기업들은 제대로 신고를 하고 있지만 소규모 기업들이 신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산자가 혼자서 책임을 이행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얼마나 도와줄 것 인지, 소비자들은 어떻게 참여할 것 인지 등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해 제도를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심상보 건국대학교 겸임교수는 "의류 폐기물을 금지시키는 건 타이틀은 좋지만 내용이 허술하다"고 했다.
김보미 변호사(사단법인 선)는 "재고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얘기하는 것보다 생산을 어떻게 예측하고 적정량을 생산할까를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