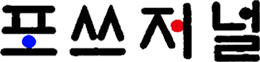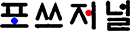한국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당사자들이 중요한 거래조건들만 계약서에 적어 넣고 나머지 조건들은 민법이나 상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적인 조건만 합의하고 나머지는 법과 관행에 따르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계약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계약체결이 매우 쉬워진다. 이런 관행 때문에 한국에서는 수 십 억원 가치의 부동산 거래도 한 페이지짜리 계약서로 마무리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 이런 형태의 계약체결방식은 계약서가 간단하기 때문에 계약의 핵심 조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관행에 변화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되었다. 즉 영미 계약법 실무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계약서를 만들 때 거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계약에 담아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서가 상당히 상세하고 길다. 이처럼 계약서가 상세하고 길면 예상한 상황이 실제로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기업간 거래에서 상당히 상세하고 복잡한 계약서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국제거래인데도 3 페이지짜리 계약서로 오랜 세월 동안 분쟁없이 사업을 잘 하기도 한다. 그런데 200 페이지나 되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도 어처구니 없는 분쟁이 생겨 사업 자체가 망가지기도 한다.
계약서가 상세하면 분쟁이 생겼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향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분쟁이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한 데 여전히 분쟁이 생기는 것을 보면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해 보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심지어는 어떤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한 후 회의장 밖으로 나와 돌아서서 그 쟁점에 대해서 다시 물어 보면 서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 충분히 합의한 것 같은데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내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언어가 가지는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실무상 계약 협상을 할 때 기본적인 합의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 초안을 먼저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계약조건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협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계약의 부수적인 조건들은 이런 순서로 협의하는 것이 효율적이기는 한데 핵심 조건들은 가능한 한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의 의도가 정확하게 이해되고 일치가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합의사항을 계약서에 녹여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의 진심과 진정한 의도가 정확하게 반영이 된 거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기초를 잘 만들어 놓으면 분쟁의 가능성도 한층 더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계약서라는 것은 합의의 결과물인 것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